삶의 향기
 >
>
- 삶을 나누며 >
- 삶의 향기
| 삶의 향기 203 - 종교개혁의 유산을 읽고 - 김항석 성도 [믿음 라브리] | 정대원 | 2014-01-20 | |||
|
|||||
|
종교 개혁의 유산을 읽고 김항석 성도[믿음 라브리] “진보의 적은 좌절이다”라는 글을 이전 어는 책을 읽다가 접한 글귀이다. 계속해서 팽창하는 경제적 구조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특성상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보수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좌절/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평안과 안착을 위하는 인간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진보도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하는 글귀였다. 뜬금없게 이런 글귀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칼 트루만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읽으면서 개혁주의 교회의 오래된 표어인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글의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이다. 개혁 되어야 하고 이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거대한 멍에로 느껴지는 것이 또 있을까? 지금의 안정된, 익숙한, 편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닌 이를 깨서라도 성경의 정의와 바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삼을까? 그 반작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유와 명분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 낼까? 칼 트루만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 하에 우리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세우려”하는 우리 아닌가?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당위성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신학, 과학, 철학과 하물며 이단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들어와서 붙이며 떼며 정당화하는 우리 아닌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 좁은문과 그 개혁의 문으로 가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초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쉼 없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들, 아마도 그것은 좌우 벽에 거울이 붙여진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한하게 비춰지는 거울 속의 모습을 보는 듯 한 느낌이다. 좁은 길—좁은 문—좁은 길—좁은 문의 연속성이랄까? 하지만 칼 트루만은 한 발 더 나아간다. ‘개혁’이라는 어쩌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익숙해 질 수 있는 “개혁”의 변화가 오히려 하나의 안착이면? 즉 개혁을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거나 익숙한 어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의 맥락의 달콤한 꽃 주변을 맴도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한다. 그는 인간의 “죄성과 우상숭배라는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최대한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말한다. 막연하다. 너무 큰 멍에, 더 큰 두려움은 끝까지 이고 가야 할 멍에, 그리고 이 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은 과연 이 개혁 자체가 행여나 내가 안착하고자 사용하는 그런 멍에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의 바른 복음과 지혜를 통해서 위안을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보게 해주신다. 가령 “루터가 선택한 방식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 후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운 부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현재 어느 상태인가?'에 대해서 물어봄에 대한 지혜를 준다. 즉 우리들 자신들이 바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견주며 살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조언과 깨우침 그리고 경고이다. 오늘 날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있는 두 생각의 충돌을 본다. 트루만의 글을 인용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다: “새로운 것이 좋고 오래된 것은 나쁘다는 생각”과 “종교개혁과 종교개혁가들을 마치 최고의 우상이나 권위인 것처럼 떠받들며, 종교개혁을 향하여 제기되는 의문이나 비판들은 모조리 이단과 동일한 것”에 대한 충돌 이다. 이는 두 글귀의 주어만 변경한다면 정치, 이념, 역사관, 경제, 정책 등 거의 모든 곳에 다 적용 가능한 1%대 99%의 충돌의 원인이다. 인간은 이익으로 인해서, 다수의 원칙을 위해서, 형편성의 원칙을 추구해서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거대한 원칙 앞에서 무너진다. 이유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그런 시공간을 넘어선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가?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기존의 것을 낮게 보는 충동과 현재에 안착하고자 강퍅해지는 마음 등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의 그런 중심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교회의 삶과 사상의 중심에 놓으려 했던 운동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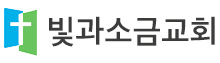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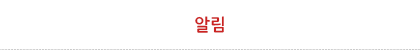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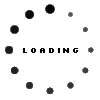
댓글 0